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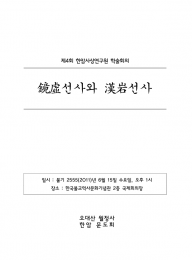
-
한암과 만공의 同異, 그 행적에 나타난 불교관
- 주제한암사상 제4집
- 시대현대시대
- 저자김광식(동국대 연구교수)
목차
위로 가기 한암과 만공의 同異, 그 행적에 나타난 불교관김광식(동국대 연구교수)
1. 서언
2. 한암과 만공의 행적
3. 한암 및 만공 노선의 성격
4. 한암 및 만공 가르침의 특성
5. 결어
상세소개
위로 가기근대불교의 고승으로 명망이 높은 승려로 漢巖(1876~1951)과 滿空(1871~1946)이 있다. 한암은 오대산 불교문화의 중심인물이고, 만공은 덕숭산 불교문화의 중심인물이다. 이들은 일제하 불교에서 오대산과 덕숭산을 주된 근거로 수행을 하면서 후학들을 제접한 선승, 도인이었다.지금껏 이들에 대한 행적, 선사상, 위상 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본 고찰은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한암과 만공의 同異點을 찾아 보려는 연구이다. 최근 근현대 불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근현대의 선지식, 고승들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고승 연구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이 지나친 선양, 과장, 배척 등 편파성이다.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과도한 이해와 평가는 엄정한 학문의 세계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혹시 이런 학문적인 범위를 넘어서 해당 본산과 문도들이 인연있는 고승을 중심으로 우열적, 종속적인 역사인식, 역사해석을 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도 철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같은 전제와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한암과 만공의 행적에 나타난 불교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러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인물에 대한 특성을 조망하고, 나아가서는 근대불교의 전체상에 대한 재조명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지금껏 일제하 고승 연구의 성과에 의하면 한암과 만공은 동일한 범주 내에서 이해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재룡은 〈근대 한국 불교의 네가지 반응 유형에 대하여〉라는 고찰에서 한국 근대불교의 4대 사상가를 극보수주의적 전통주의자 송경허, 개혁주의자인 백용성(대각교운동), 개혁주의자인 박한영(불교교육론), 극진보주의적 개혁주의자 한용운(사회 참여적인 민중불교)으로 대별하였다. 이러한 근대 불교사상가의 유형을 수긍한다면 한암과 만공은 송경허로 대변되는 전통주의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병욱은 〈한국 근대불교사상의 세가지 유형〉이라는 고찰에서 한국 근대불교의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회 참여를 지향하는 한용운, 불교의 교육 및 포교 분야에서 개혁 과 변화에 앞장 선 박한영과 대각교운동을 통하여 불교계의 혁신을 추구한 백용성, 전통을 계승하였던 방한암을 거론하였다. 이병욱은 그의 고찰에서 경허와 만공은 뚜렷하게 거론하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특이점은 방한암을 별도의 노선, 사상으로 본 것이다. 이런 구분 즉 심재룡과 이병욱의 연구는 불교사상의 관점에서의 성과물이다. 한편, 필자는 이와 같은 사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당시 현실에 나타난 노선의 관점에서 근대불교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필자는 〈식민지(1910~1945) 시대의 불교와 국가권력 이라는 논고에서 일제하의 불교 노선을 조선불교 조계종(대처승)의 흐름, 조선불교 선종(선학원, 수좌) 의 흐름, 만당(한용운, 진보개혁)의 흐름, 대각교(백용성, 온건개혁)의 흐름으로 대별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한암과 만공을 의식하여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선종, 선학원 흐름에 포함시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에 의하면 한암과 만공은 기본적으로 경허의 법제자이었기에 경허의 계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활동적인 측면에서 만공은 수덕사, 마하연 등지의 조실을 역임하면서도 선학원 창설 및 재건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한암은 오대산에 칩거, 은둔하면서 수좌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만공과 한암은 선학원 수좌들이 만든 조선불교선종의 종정이었기에 동질적인 노선을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암과 만공은 경허, 선학원, 전통주의자라는 동질적인 이해의 틀이 나와 있다. 그렇지만 한암은 1929년의 교정, 1941년의 조선불교 조계종, 해방공간의 교정 등을 역임하였기에 만공과는 약간의 이질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암은 은둔적인 수행을 주된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불교계 대표를 역임하였지만, 만공은 산문과 세속을 넘나드는 개방성을 견지하면서 선풍진작, 불교정화를 기하였다. 이처럼 한암과 만공은 同異가 교차되는 고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별성, 이질성에 대한 연구는 심화되지 않았다. 한암과 만공은 경허의 법제자이면서도 개별적인 산문에서 수행한 것과 불교사상 등에 대한 독자성은 주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만공은 경허의 그늘에 가려 있었고, 한암은 그를 상징하는 오대산 불교문화에 대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즉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한암과 만공이 갖고 있는 특성, 독자성, 계열성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 비록 이병욱이 한암에 대한 독자성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아직 이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한 실정이다. 요컨대 만공은 덕숭문중, 경허 제자라는 하나의 큰 틀, 관점에서만 인식되었고, 한암에 대한 어떤 독특한 인식, 오대산 불교문화라는 개별적인 이해의 관점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지적일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면서, 한암과 만공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 분석을 통하여 한암의 특성 추출을 위한 기초적인 관점의 검토를 하고, 만공의 연구에서는 그가 경허와의 차별성이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심화를 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