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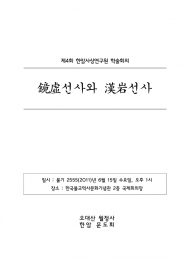
-
鏡虛의 지음자(知音者) 漢岩
- 주제한암사상 제4집
- 시대1910년
- 저자윤창화(민족사 대표, 한암사상 연구자)
목차
위로 가기 鏡虛의 지음자(知音者) 漢岩윤창화(민족사 대표, 한암사상 연구자)
1. 시작하는 말
2. 경허와 한암의 조우(遭遇)
3. 경허의 인가(印可)
4. 경허의 지음자 한암
5. 한암의 경허 昇華 작업
6. 마무리--맺는말
상세소개
위로 가기鏡虛선사(1846-1912)와 漢岩(1876-1951)은 스승과 제자 사이로서(師資之間), 모두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두 선승은 비슷한 시기를 살았다. 경허는 한일합병(1910년)을 목도했고, 한암은 해방과 6․25를 목도했다. 경허와 한암은 모두 다 禪을 지향했지만, 그 교화 모습과 행적은 매우 다르다. 스승 경허가 근대 한국선의 중흥조로서 오로지 禪을 중시했다면 한암은 禪과 계율, 교학 모두를 중시했다. 경허가 무애도인으로서 원효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한암은 의상이나 자장처럼 師表적인 길을 걸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개성은 확연히 달랐지만 그러나 서로를 매우 존중했다. 한암은 경허의 法을 존중했고 경허는 한암의 수행과 인품을 존중했다. 본고의 목적은 師資之間으로서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경허와 한암의 관계,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印可 과정과 師資 간의 密度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경허화상은 법제자 한암을 지칭하여 ‘지심(知心)’ ‘지음(知音)’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허의 법제자는 혜월, 만공, 한암 등 4-5인이 되는데, 이 가운데 ‘지심자(知心者)’나 혹은 ‘지음자(知音者)’라고 표현 한 경우는 漢岩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허선사가 한암의 어떤 점 때문에 지음자라고 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