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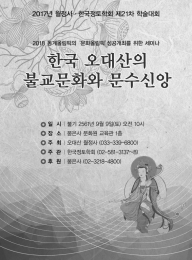
-
漢巖의 上院寺 移居와 시기 검토
- 주제한국 오대산의 불교문화와 문수신앙
- 시대1929년
- 저자동국대(서울) 다르마칼리지 교수 _ 이원석
목차
위로 가기 漢巖의 上院寺 移居와 시기 검토동국대(서울) 다르마칼리지 교수 _ 이원석
Ⅰ. 머리말
Ⅱ. 1920년대 전반의 佛敎界와 五臺山門
Ⅲ. 奉恩寺 주석과 上院寺로의 移居
Ⅳ. 1925년⋅1926년 歸山說의 검토
Ⅴ. 구술 자료의 분석과 1926년의 五臺山行
Ⅵ. 맺음말
상세소개
위로 가기漢巖(1876~1951)의 생애 가운데 극적인 전환점은 修道山 奉恩寺에서 五臺山 上院寺로의 이거였다. 근현대의 전환기 한암은 오대산에서 자신만의 불교세계를 구축하였다. 그는 1929년 이래로 禪敎兩宗의 敎正⋅朝鮮佛敎禪宗의 宗正, 특히 朝鮮佛敎曹溪宗의 초대 宗正을 역임하였고, 사상적으로 定慧雙修와 禪敎融合, 수행적으로 戒定慧 三學兼修을 강조한 고승이다. 그 내용물로서 ‘持戒’, ‘守拙’과 ‘僧家五則’의 僧行, 看話禪과 ‘保任’ 의 중시, ‘경전과 강학의 병행’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漢巖象’은 모두 오대산 상원사에서 구축되었으니, 오대산은 방한암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絶對 佛緣의 공간이었다. 게다가, 한암이 오대산으로 향하면서 읊은 “차라리 천고에 자취 감춘 학이 될지언정 봄날에 재잘대는 앵무새를 배우지 않겠노라!”는 歸山詩는 널리 회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27년간 不出洞口’와 연결되어 상징화되었다. 이는 도리어 그 주변의 사실을 흐리게 만드는 역설로 작용할 정도였다. 반면에 한암의 상원사 이거와 그 주변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한암의 생애에서 봉은사 판전 조실과 관련 부분은 자료의 부족으로 윤창화의 연구가 유일하지만 공백은 여전히 많다. 또한 한암의 상원사 이거에는 흔히 거론되는 월정사의 부채를 해결하려는 李鍾郁의 초빙과 한암의 위장병 치료 논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한암의 오대산 歸山 연도는 그 핵심이다. 후술하듯이, 「연보」에 언급된 ‘1925년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1926년설’을 제기하는 견해도 적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기에는 五臺山門의 전통적 종교적 입장이나 사실적 논증과 합리적 해석 사이에 발생하는 견해의 차이 등이 반영되어 있다. 물론 그 기저에는 『定本 漢巖一鉢錄』의 내용이 풍성하지 못한 점과 구술자와 대담자의 문제가 잠복된 회고자료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의 발굴과 함께 엄격한 사료 비판이나 체계적인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 이상을 염두에 본고는 한암이 봉은사에서 상원사로 이거하는 배경과 원인,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행의 시기를 검토하여 再定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우선 1920년대 전반 일제의 사찰령 체제 아래에서 불교계의 동향과 五臺山門의 실정을 살펴보고, 한암이 봉은사 주석과 상원사로 이거하는 주변을 추적하여 그 배경과 원인을 고찰하겠다. 그리고 한암의 오대산행 시기를 ‘1925년설’과 ‘1926년설’로 대별하여 분석한 다음 구술 자료를 해석하여 후자의 상대적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상의 작업은 한암의 기초 연구에 일조하리라 기대되지만, 부득이하게 연구자의 실명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삼가 너그러이 양해를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