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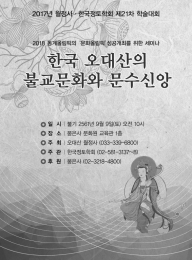
-
인도불교 문수신앙의 특징 검토
- 주제한국 오대산의 불교문화와 문수신앙
- 시대7세기 후반
- 저자동국대학교 연구원 _ 강향숙
목차
위로 가기 인도불교 문수신앙의 특징 검토동국대학교 연구원 _ 강향숙
Ⅰ. 서론
Ⅱ. 인도에서 문수보살의 이미지
Ⅲ. 중기 밀교경전 나타난 문수신앙
1. 오자주법(五字咒法)의 오자진언
Ⅳ. 후기 밀교경전에 나타난 문수신앙
1. 본초불(本初佛) 문수
2. 분노존의 부족주(部族主) 문수
3. 성취법의 수호본존(守護本尊) 문수
Ⅴ. 결론
상세소개
위로 가기문수보살은 인도⋅네팔⋅티베트를 비롯하여 중국⋅한국⋅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신앙되어 왔다. 불교의 개조 석가모니불이 열반한 이후 대승불교시기에 싹튼 보살 사상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보살들을 탄생시켰다. 그 중에서도 문수는 일찍이 초기 대승경전에 등장하며, 이 보살의 명호(名號)를 들으면 지혜란 단어가 연상될 만큼 지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삼존불(三尊佛)로 구성된 불상에서 문수보살은 석가모니불의 왼쪽 자리에 앉아 연꽃줄기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같이 ‘지혜’와 ‘석가모니불의 좌협시(左挾侍)로서의 문수보살’은 이 보살의 대표적 이미지로 여겨지지만, 불교가 유전(流轉)된 지역과 문헌에 기술에 따라 문수보살의 좌법(坐法)⋅머리모양⋅승물(乘物)⋅지물(持物) 등은 차이를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도 문수보살은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의 지혜를 상징하며, 이러한 문수보살의 지혜로 가피(加被)를 얻어 학업을 원만히 성취케 하는 보살로 신앙되기도 하며, 동자로 화현(化現)한 문수보살을 친견하여 세조임금이 등창병을 치료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본고는 인도불교에서 문수신앙이 성행했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서(端緖)로 현존하는 문수보살 도상(圖像)의 검토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도상은 주로 불교예술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소재지만, 종교에서 도상은 특정 대상에 대한 숭배와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문수보살 조각상에 대한 이미지와 특징의 추출은 인도불교에서 문수보살의 원형(原形)을 제시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문수보살 중에서도 어떤 유형의 문수보살이 신앙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밀교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에 나타난 문수신앙의 특징을 검토한다. 문수보살은 대승경전 초기부터 등장하지만 미륵보살이나 관음보살에 비해 그다지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음보살이 중생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보살로 강조되어 인도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높이 신앙되었지만, 문수보살은 지혜의 특성이 부각되어 직접적인 구제를 강조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존격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수신앙은 7C후반부터 12세기에까지 인도에서 지속되고 유행했음을 사다나말라(Sādhanamālā, 成就鬘), 니슈빤나요가발리(Niṣpannayogāvalī)와 같은 성취의궤서에서 확인되며, 마하바즈라바이라바 딴뜨라(Mahāvajrabhairavatantra)에서는 문수보살의 구제적 특성도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필자는 대승경전에서 강조된 문수보살의 지혜적 측면을 중기 밀교경전에 속하는 금강정경유가문수사리보살법일품(金剛頂經瑜伽文殊師利菩薩法一品)[이하 오자주법(五字咒法)으로 약칭]을 통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후기 밀교경전 나마상기띠(Nāmasaṃgīti), 마하바즈라바이라바 딴뜨라에 나타난 문수보살의 특성과 신앙을 살펴본다. 후기 밀교경전은 티베트를 제외하고 극히 일부만이 중국으로 전해져 한역되었을 뿐 경전의 유포와 유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기 밀교경전에서 문수신앙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한국⋅일본 등 동북아시아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은 인도불교 특유의 문수신앙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승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자비존 문수보살이 점차 분노존의 부족주(部族主)이자 성취법의 수호본존(本尊)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하고 인도불교에서 문수신앙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